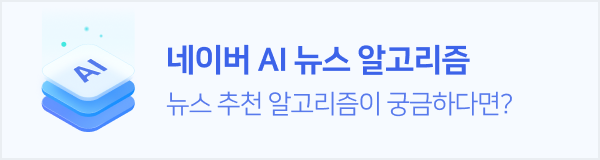화장품 포장회사 노동자
기륭전자 노조 동료들과 해고돼
파견직 떠돌다 화장품 포장 라인
숙련 기회 안 주고 부품 쓰듯 교체
“자부심 갖고 싶지만 물건 취급”
“7년 일한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어깨를 수술했어요. 힘줄이 끊어졌대요.”
20대 초반 섬유공장에서 시작해 지난해 화장품 포장회사에서 정년퇴직하기까지, 명순씨는 여러 제조업 현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며 살아왔다. 자녀가 어렸던 30대에는 집 가까이 문구공장에 또래 엄마들과 다녔다. 9년 동안 상여금을 안 주던 회사는, 폐업하면서 직원 10여명의 퇴직금과 밀린 4개월분 급여마저 떼어먹었다.
“내가 그랬어요. ‘이제 조그만 데 가지 말자. 큰 데 가자.’ 9년 노동이 아깝잖아요. 조그만 데 다니면 더 못 받잖아요.”
노동자를 떠돌이로 만든 파견노동
큰 회사라면 이런 피해는 없겠다 싶어, 명순씨는 구로공단(현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으로 갔다. 300명 규모의 기륭전자에 취직해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다. “그때가 40대 초반이었어요. 여기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다녀야지 했어요. 파견,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다 직원이겠거니 하고 간 거예요.”
명순씨를 포함해 250여명이 파견직이었다. 최저임금을 받았다. 회사 눈 밖에 나지 않으려 장시간 노동을 버텼다. 퇴근길에 누군가 문자로 해고당하고 다음날 새 얼굴로 대체되는 일이 잦았다. 그러니 관리자는 까딱하면 윽박지르고 노동자는 쩔쩔맸다. 명순씨는 2년 뒤 노동조합을 만든 동료들과 해고당했다.
제조업 생산직에 파견 노동은 불법이지만, 그런 일자리뿐이었다. 명순씨는 피시비(PCB) 부품을 조립·납땜하고, 정수기와 스마트폰 배터리를 조립하고,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로 계속 떠돌아야 했다. 고용 기간은 짧게는 몇달에서 길면 1~2년. 명순씨가 아무리 일 잘하고 성실해도,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다 정년을 맞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
그랬는데 명순씨가 한곳에서 7년을 일했다! 정규직으로! 분명 그이가 해낸 일. 어깨 힘줄과 맞바꿨을까.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완전히. 화장품 포장업체에서 일했어요. 빈 용기 뚜껑을 열어 원청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을 담는 게 1차 포장. 아이섀도나 파운데이션팩트류의 색조 화장품을 그렇게 해요. 불량 검사하고 뚜껑 덮고 라벨 붙이고 제품 종이상자에 넣는 게 2차 포장. 선스틱이나 스틱파운데이션은 완제품을 받아 라벨 붙여 포장하고요. 원청이 자기 건물에 이런 포장업체를 하청으로 여럿 들여 서로 경쟁시켜요. 나는 파견직으로 들어가 10개월 일하고 정규직이 됐어요. 좋았죠.”
30~40명의 여성노동자가 각 라인 공정에 맞춰 일한다. 라벨 붙이는 사람만 의자에 앉고 모두 종일 서서 일한다. 발바닥부터 다리 허리 등 목 머리 어깨 팔 손까지, 몸 아끼지 않고 일한다. 명순씨는 출근 첫날 종이 케이스를 접다가 반나절 만에 라인을 탔다. 이제까지 해온 일이 컨베이어벨트 라인 타는 일들이었다.
“내가 안 해본 일 없이 이것저것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이거 나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죠. 일은 잘 해낼 자신이 있는데, 정규직이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불안했죠. 오자마자 잘리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라인 작업이라 조금만 손이 느려도 탈락시켜요. 관리자가 파견 회사에 전화하면 알아서 문자로 해고하고, 다음날 새로 사람을 보내주잖아요. 일이야 시간 두고 가르치고 배우면 되는데 숙련할 시간을, 기회를 아예 처음부터 안 줘요. ‘얼마든지 사람 많아’ 이거죠. 계속 들어오고 자르고 계속 들어오고 자르고 수없이 그러더라고요.”
관리자는 실적을 위해 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쳤다. “빨리빨리 해!” “많이 해!” “그렇게 해갖고 몇개나 해?” 불량 하나 나오면 ‘누구누구씨!’도 아니고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대며 대놓고 면박했다.
“하청이잖아요. 수량을 많이 해야 돈이 되니까. 관리자가 옛날 소 부리듯 그렇게 일을 시켜요. 관리자가 호랑이처럼 화내고 소리 지르면 우리는 기죽어 그렇게 할 수밖에요. 몇년 동안 듣다 보면 우리도 그런 지적에 적응돼 따라가요. ‘그렇게 하면 부장님한테 혼나, 혼나. 빨리빨리 해야지.’ 그런 식으로, 애기들이 어른 무서워하듯이, 혼난다고.”
그런데 정규직이 되어도 연차휴가가 생긴 것 말고는 아무 달라진 게 없었다. 명순씨보다 오래 다닌 사람도, 명순씨도, 오늘 온 사람도 모두 최저임금이었다. 토요일 포함 주 3~4일 시간 외 근무로, 퇴직 막달에 명순씨는 세후 230만원을 받았다. 쉬는 시간은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하루 최소 7시간40분에서 9시간40분을 꼬박 서서 일했다.
“정규직이 돼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7년을 일해도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 오른 거밖에, 명절에 받는 식용유가 전부예요. 상여금요? 7년 동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일했어요.”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뉴스레터’를 쳐보세요.
☞한겨레신문 정기구독. 검색창에 ‘한겨레 하니누리’를 쳐보세요.
손톱 빠지고 어깨 주사 맞아가며
명순씨는 일하는 몇년 동안 식당이 있는 원청 건물 4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렸다. 원청 관리자가 “누가 타래?”라며 하청 직원들에게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했다. 종일 서서 손톱 빠져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밥 편히 먹기도 힘들었다니.
“리필용 파운데이션팩트를 포장하는데, 리필 용기가 한줄에 한 60~70개씩 꽂혀 와요. 이걸 작업대에 올려 하나씩 잡아 빼서 라인에 간격 맞춰 흘려줘요. 엄청 빡빡하게 겹쳐 있어 빼려면 손이 아파요.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 잔업까지 하고 다음날 오전까지 했더니, 손이 파래지더니 엄지손톱에 피멍이 들고 너무 아파요. 잔업 때문에 다음날 퇴근하고서야 약국에 들러 약을 사 먹었어요. 나중에 손톱이 흔들거리다 며칠 뒤 빠졌어요.”
빈 용기 하나는 가볍지만 그런 게 몇백, 몇천개씩 담긴 비닐봉지를 들어 배 높이 작업대에 올리면서 작업하다 보면 어깨를 다친다. 완제품인 선스틱이나 파운데이션스틱은 제품 무게가 더 나간다. 그런 용기를 하루 3만개 이상 라인에 까니까 무리가 가겠지.
“어깨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토요일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한달 맞으면 두어달은 또 안 아프고 일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 일년에 한번만 맞아야 한대요. 많이 맞으면 힘줄이 가늘어지고 약해진다고. 그런 걸 나는 일하려고 일년에 몇십번을 맞았죠.”
명순씨는 어디라도 가서 일하고픈 마음을 잠시 재워두고 올해는 어깨와 팔을 아껴 몸을 회복하려고 한다.
“우리는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어요. 누가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열심히 한 거죠. 회사나 관리자가 좀 대우를 해주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인정해주고, 생각만 해줘도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장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사람을 그냥 물건 취급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대하니까 항상 불안하죠. 현장은 살벌해요. 돈 벌어먹고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인내심을 갖고는 버티기 힘들어요.”
르포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