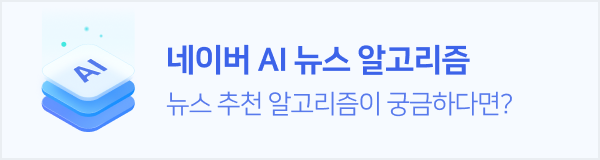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해 ‘보험료 차등 인상’과 보험료와 급여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을 도입하고,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률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에 중점을 뒀지만,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 소득보장 기능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을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은 9월4일 발표한다.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는 출산율, 기대여명, 경제 성장률 등에 맞춰 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가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와 정체된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금액을 삭감하는 장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보고서를 보면,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경우 205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의 생애 총 급여는 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대 간 보험료 인상율 차등은 보험료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세대의 보험료율은 느리게, 중·장년세대의 보험료율은 더 빠르게 올리는 방안이다. 청년층 불신을 잠재우겠단 계획이지만, 중·장년층 반발은 물론 세대 안에서도 형편이 달라 적용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은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에는 현재도 제3조2(국가의 책무)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재원을 투입한다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존에도 법 조항이 있지만, 이를 더 직접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라면서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함께 개혁해 노후 보장을 다층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월 40만원을 임기 안에 달성하겠다고 했다. 내년엔 34만3510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아울러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을 늘리고, 모든 기업들이 퇴직연금 채택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인연금 가입자가 전체 연금 가입자 2383만명(2022년 기준)의 457만명(19%)에 그쳐, 정부 혜택이 중산층 이상으로만 그칠 수 있다.
정부의 개혁 방안을 두고 소득 보장성 강화 방안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자동 안정화 장치는 보장성이 오히려 깎이는 장치”라면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방안이 부족해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는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홍식 교수도 “기초연금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가 크고, 국민연금은 이에 더해 은퇴세대의 소득을 유지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 기능이 다르다”면서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신하긴 어렵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은 ‘차등적으로 더 내고 모두가 덜 받는’ 개악”이라면서 “국민의 노후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더 걱정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